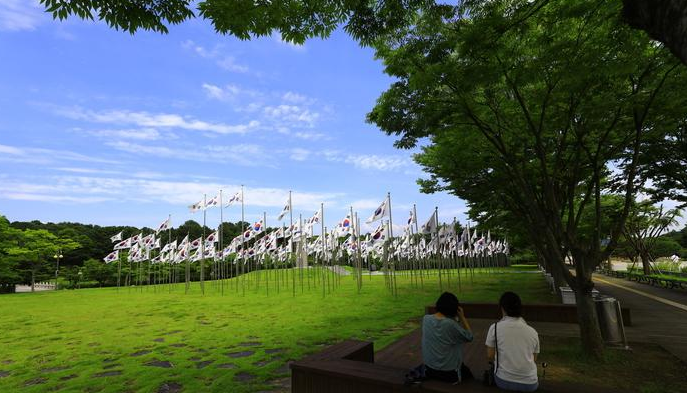오골계가 아닌 오계라 불러다오 논산 연산오계
오골계가 아닌 오계라 불러다오 논산 연산오계
대전에서 논산으로 가는 4번 국도를 따라가면 개태사, 돈암서원, 황산벌, 관촉사 등 제법 굵직한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이 산재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표지판이 하나 있다.
천연기념물 제265호로 지정된 ‘연산 화악리의 오계’ 표지판이다.
오골계와는 차원이 다른 독특함과 천연기념물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보양식으로 맛볼 수 있는 특별함이 있다.
뼛속까지 검은 그대, 오계(烏鷄)를 만나보자.
왕건의 명으로 창건된 개태사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중 하나인 연산 화악리의 오계를 만나볼 수 있는 지산농원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가운데 사람의 손에 사육, 관리되는 축양동물이 있는데, 올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흑우를 포함해 모두 6종이다.
연산 화악리의 오계도 진도의 진도개(제53호), 제주의 제주마(제347호), 경산의 삽살개(제368호), 경주개 동경이(제540호)와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축양동물이다.
연산 화악리의 오계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재래 닭으로 인정받아 1980년 천연기념물 제265호로 지정되었다.
닭은 원래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입 경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현재의 모습으로 토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계가 문헌상에 등장하는 것은 고려 말 문신인 제정 이달충의 문집 《제정집》인데, “요승 신돈이 오계와 백마를 먹고 정력을 보충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조선 숙종이 오계를 먹고 건강을 회복한 뒤 오계가 충청 지역의 진상품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가장 가깝게는 연산 지역의 통정대부 이형흠이 철종에게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형흠은 오계의 지정 사육인인 지산농원 이승숙 대표의 5대 조부다.
오계는 흔히 알려진 오골계와는 차이가 분명한데도 오골계와 혼동하기 십상이다.
오골계는 일본의 천연기념물로, 털은 흰 반면 뼈가 검어 오골계라 불린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 《동아일보》에 오계를 소개하면서 오골계라 불러 혼선을 빚은 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래 닭은 오골계가 아닌 오계가 맞다. 유홍준 선생이 문화재청장으로 있을 때 비로소 오골계에서 오계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연산 화악리의 오계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오계는 외형뿐 아니라 뼈까지 검다.
《동의보감》 <금수편>에는 “닭의 눈이 검으면 뼈도 반드시 검은데 이것이 진짜 오계”라는 내용이 나온다.
오계는 털뿐 아니라 발, 볏, 눈동자와 눈자위, 피부와 뼈까지 까맣다.
가만히 다가가서 보면 전체가 검은 가운데서도 푸르스름한 기운이 도는데 그 빛깔이 참으로 곱고 오묘하다.
오계는 야생 조류에 가까울 정도로 성질이 예민하고 까다롭다.
가둬놓고 사육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죽기도 해 사육하기 힘들다고 한다.
게다가 일반 닭보다 성장 속도가 5배 정도 느릴 뿐 아니라 하루에 하나씩 알을 낳는 양계에 비해 오계는 4~5일에 한 개씩 낳는다.
몸집이 작고 활동성이 좋지만 속된 말로 “체구도 작은 놈이 하도 싸돌아다녀 살이 안 찐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오계는 경제성이 떨어진다. 1970년대 들어 양계가 도입되면서 오계는 서서히 도태되기 시작했다.
오계는 1980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천연기념물 지정 문서에 “한국의 희귀 축양동물인 오골계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1970년대를 거치면서 멸종 위기의 시간을 걸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몇 수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오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2대에 걸쳐 30년 넘게 사육, 관리되고 있다. 사육이 까다롭고 지원이 없다 보니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지산농원 이승숙 대표는 1999년 아버지 병간호를 하러 내려왔다가 이곳에 발을 붙였다.